부엉-로그
헤르만 헤세<데미안>조용히 삶에 닿아 숨 쉬는 이야기 본문
딱딱하지만 부드럽다. 관념적이지만 삶에 닿아 있다. ‘데미안’은 처음 읽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번 새로운 울림이 있는 책이었다. 때로는 읽다가 지루해져 눈이 감기기도 했지만, 어느 날 다시 책을 펼치면 새로운 예감이 몸을 감쌌다.
헤르만 헤세와 영혼이 닮은 사람만이 데미안을 흥미롭게 읽었을까? 아니다. 이 소설은 인간이 가진 영혼의 동질성을 말한다. 얼마나 깊이 내면의 우물을 파고 들어갔기에 거기까지 갔을까. 상상만으로도 아찔하다.
많은 사람들이 내적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모르는 어린아이에 머물러있다. 소수만이 이런 관념을 꽤 상세히 이해하고 당당하게 살아간다.
나는 한 사람의 본질이 무수한 조각으로 쪼개져 세상에 흩어져 있다고 믿는다. 인생은 조각을 찾고, 맞춰가는 여정이다. 보다 많은 조각을 회수하고 맞춘 사람들이 바로 내가 말한 소수다. 사람들 대부분은 경험을 통해 삶을 이해하는데, 오늘날 경험의 영역은 비정상적으로 복잡하다. 선택의 폭이 너무 넓다. 나 역시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오랫동안 씨름했다.

나는 영상 매체를 좋아한다. 한편 책도 읽는다. 욕심대로라면 독서에 더 무게를 두고 싶은데 좀처럼 어렵다. 요즘 들어 새로이 고민하는 문제다. 읽기가 반드시 필요한가. 영상 매체를 글로 치환해서 이해하는 능력과 다시 글로 재현할 능력만 있다면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였다.
대답은 no! 10쪽을 할애하는 묘사를 화면으로 1초 만에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 역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결국 선택과 표현의 문제다. 어디에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할 것인가. 이 답에는 ‘데미안’의 기여가 컸다.
‘데미안’은 어떤 연유로 소설이 가져야만 하는 요소를 획득했을까. 아마도 서사에 내면의 불가해한 감정이 절묘하게 녹아들어 그렇지 않았을까. 이러한 성격 때문에 영상으로 연출하기 몹시 까다로울 것 같다.
기존에 알고 있어서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은 사건들. 소설은 그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길 요구한다. 카인과 아벨 이야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이것은 단지 예시일 뿐,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가 널리고 널렸으며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호기심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나는, 이 소설을 거듭 읽음으로 각성의 시간을 갖는다. ‘데미안’은 굳어버린 나의 눈을, 마음을 어루만진다. 그리고 말을 건넨다. 가슴 안에 이미 존재하는 고귀함을 탐색해 새로 태어날 기회를 얻으라고.
작가는 내면의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동시에 말을 위한 말은 싫어했다. 데미안의 입을 빌려 “살아내는 생각만이 가치가 있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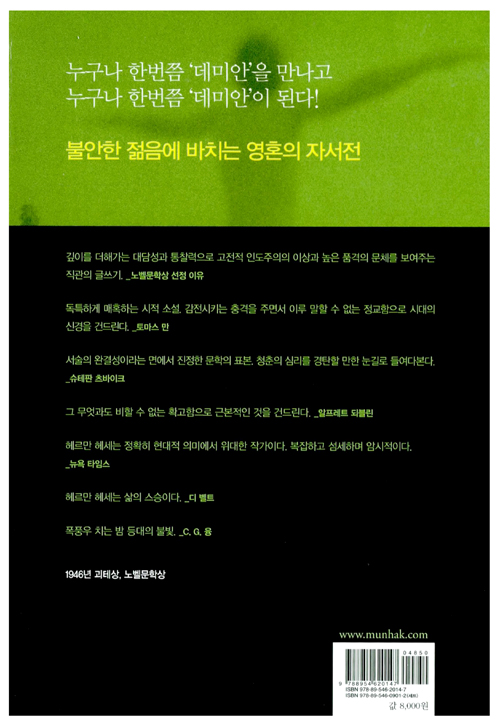
꿈을 꾸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나아간다. 그 과정에 발자국이 찍힌다.
절실한 꿈이라면 꼭 이루어질 거라는 막연한 믿음을 품고 살았다. 단지 꿈을 꾸고 몰두하는 데만 정신이 팔렸다. 그런데 돌아보니 지금껏 내가 꾸었던 꿈이 진짜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진짜는 희망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찍힌 나의 발자국이며, 지금 내딛을 한 걸음이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얻을까, 오랫동안 고민했다. 이 주관식 문제에는 여러 가지 해답이 존재하겠지만, 나는 ‘순수성’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 피가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싱클레어는 삶을 어둡게 바라보기 시작한 뒤부터 밝은 세계가 아예 사라진 줄 알았지만, 그것은 무언가로 덮여 있었을 뿐이었다.
헤르만 헤세가 말하는 ‘나에게로 가는 길’은 사실 길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나아가야만 비로소 길이 된다.




